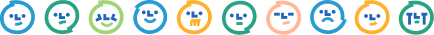[오늘청년]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청춘을 어떻게든 꼭 붙잡고 싶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빈자리가 공허하다.
청춘이 지나가고 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에 담긴 밥에서
김이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무엇인가 영원히 지나가버렸다고
지금도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고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을 먹었다
한강 <어느 늦은 저녁 나는>
흰 공기밥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청춘이 서서히 내 삶에서 사라지고 있다. 영원히 지나가버리고 있다.
내게 청춘은 뭐든 시도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질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능성의 크기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다. 잠재력만으로 빛나는 시절이었다. 그리고 정말 부유했던 시절이었다.
그 당시 나는 정말 부유했다. 금전상으로가 아니라 양지바른 시간과 여름의 날들을 풍부하게 가졌다는 의미에서.
헨리 데이비스 소로 <월든>
이제 푸르렀던 그 계절이 지고 있다. 빛이 바래지고 있다. 나는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다. 가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붙잡듯, 나의 한 시절을 붙잡고 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시절을.
부유했던 시간은 지나가고
내가 제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봐야 청춘의 나처럼 부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앞으로 벌어들 일 돈과 시간은 결국 무거운 현실을 떠받치는 데 쓰일 것이다. 양지바른 날을 온전히 즐길 수 없는 나는 점점 가난해지는 중이다.
어린시절 나는 빨리 스무 살이 되고 싶었다. 본격적인 '청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이다. 20대 초반의 나는 또다시 20대 후반의 나를 꿈꿨다. 젊은 날의 모든 의무와 공부를 다한 나이, 사회에 나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시작하는 나이 말이다. 이 시기를 '청춘의 정점'이라고 믿었다.
청춘의 정점에 이르기 까지는 해가 지날수록 몸도, 마음도 쑥쑥 성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성장판이 닫힌지는 오래고, 생물학적 전성기도 지나갔다. 이제는 마음의 성장판마저 서서히 굳어가고 있다.
어른은 청춘을 잡아먹는다
지난 1년간 나는 꿈보다 현실을, 도전보다 안정을 택했다. 꿈을 바라보는 초점을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고 여러 도전의 기회를 미뤘다. 대신 회사에 출근했다. 전셋집을 구했다. 운동하고 책읽고 친구들을 만났다. 남들과 비슷하게 살며 '괜찮은 삶'을 설계했다. 그래, 잘 살았다. 그런데 그 삶 속에 '청춘'은 없었다.
사실 젊은 패기만으로는 살 수 없었다. 현실 감각 없이는 험난 세상을 버텨낼 수 없었다. 나는 어른스러워야 했다. 회사 월급, 대출금리, 자기계발 등 아주 어른스러운 단어들로 내 삶을 감쌌다. 어른스러움을 강요하는 현실에 나의 청춘이 잡아먹혔다. 뜨거웠던 열정은 냉랭해지고, 앞뒤 안가렸던 패기는 차분해졌다. 그렇게 나의 젊음이 점점 늙어갔다.
누군가 말하길, 공동묘지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고 했다. 실현되지 못한 꿈이 잠들어있는 땅이라고 했다. 청춘을 떠나보낸다는 건, 나의 일부를 먼저 땅 속에 묻는 것만 같다. 내가 묻히기도 전에 스스로 내 꿈을 먼저 묻고 있다.
청춘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결코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는 것 같다. 청춘이 청춘인지도 몰랐던 시절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청춘!"하며 기꺼지 나의 젊음을 담금질했다. 막상 진짜 떠나갈 때가 되어가니 청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 만큼 가슴 사무치는 말도 없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청춘을 어떻게든 꼭 붙잡고 싶다. 스미는 아쉬움과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 이것이 요즘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청춘이 지나간 자리에는 슬픔과 분노만 남았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빈자리가 공허하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고없는 날들을 잡으려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거야
김창완 작사, 산울림 노래 <청춘>, 1981
김필 노래 <청춘>, 2015
<청춘>은 1981년 처음 발매된 곡으로, 당시 만 27세 김창완(54년 출생)이 작사/작곡하고 그의 밴드 산울림이 불렀다. 2015년에 만 29세의 김필(86년 출생)이 다시 불렀다. 이 곡은 언젠가 다가올 청춘의 끝과 그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차라리 청춘을 보내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김창완과 김필이 이 노래를 불렀던 나이가 지금의 나와 비슷하다. 한편으로는 20대 후반인 지금이 청춘을 떠나보낼 시기인건 아닌가싶다. 청춘에서 돌아서서 진짜 어른으로 나아가는 전환기 말이다. 뜬구름 잡던 손을 이제 그만 거두고, 땅처럼 단단한 현실을 딛고 서야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젊음을 고수하는 건 좋지만, 아이처럼 찡찡대서는 안된다. 청춘 이후에 밀려오는 무게와 책임을 거부하지 않고 담담히 받아들여야만 한다. 젊음을 당당히 벗어 던져야만 한다.
푸른 봄을 꼭 지키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청춘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 푸르던 시절을 향한 빈 손 짓을 조금만 더 오래 하고 싶다. 청춘은 단순히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직 실패하지 않은 꿈, 아직 무너지지 않은 희망, 아직 열려있는 마음, 이것으로 짜여진 거칠고 푸른 직물이다.
하고 싶은 일이 많다. 실현시키고 싶은 이상이 있다. 그 중 몇가지는 분명히 젊은 날 이루어야만 의미 있는 것이다. 이 꿈을 이루거나 혹은 포기하기 전 까지 계속해서 청춘 졸업을 미루고 연기시킬 것 같다. 아직 청춘을 떠나보낼 수 없다.
희망하건대, 더 많은 시간이 지나 몸이 늙고 현실이 무거워져도 청춘의 마음만은 남겨두고 싶다. 청명한 빛을 내는 이 푸른 봄을 품고 살아가고 싶다. 나는 오늘도 내 안의 푸른 봄을 아주 단단히 끌어 안는다.
* 글쓴이 - 벤자민
낮에 코딩하고 밤에 글쓰는 사람.
삶을 통과하며 마주친 감정과 생각을 문장으로 길어냅니다.
매주 제 삶의 한 조각을 나누는 뉴스레터 <주간 벤자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 https://maily.so/weeklybenjamin
브런치 - https://brunch.co.kr/@weeklybenjamin
* [오늘청년]은 청년들이 직접 청년 당사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 <오늘은, 청년예술>에서는 청년 담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기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chek68520@gmail.com으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