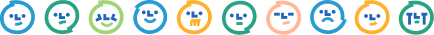[청년담론] 청년의 조건 : 꿈꾸는 자, 그대가 진짜 청년
누군가 내게 “당신은 청년이 아닙니다.”라고 매몰차게 말해도 딱히 반박할 말이 없다. ‘청년’이라 하면 우리는 대개 20대의 푸릇푸릇한 젊음과 넘치는 에너지를 떠올린다. 그러니 40대의 얼굴을 한 내가 청년의 자리를 요구하기는 민망하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은 시시때때로 바뀐다. 최근 들어 나라에서 인정하는 청년의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만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일부 지자체는 아예 49세까지도 청년 범주에 포함한다. 고령 근로자를 활용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일 것이다.
‘억지 청년’일지언정 이런 변화 덕에 청년의 범주 안에 한 발을 살짝 들여놓을 수 있게 되니 뜻밖에도 마음이 설렌다. 실제로 달라진 건 없다. 어정쩡한 나이도, 싱그럽지 않은 얼굴도, 물먹은 솜처럼 축축 늘어지는 몸도 모두 그대로다. 그런데도 “당신은 때에 따라 청년이라고 주장해도 좋습니다.”라는 식의 이 조건부 허가증 앞에서 나는 왜 이토록 설레는 걸까?
‘청년’이라는 단어 앞에서 마음이 두근거리는 건 얼마든지 꿈꿀 수 있는 특권 때문이다. 내게 ‘청년’ 혹은 ‘청춘’이라는 범주는 널따랗고 안전한 운동장처럼 느껴진다. 그 안에서라면 얼마든지 꿈꾸고 가능성에 도전해도 좋다고 세상이 허락한 가장 넓은 놀이터 말이다. 물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안전하고 신나게 뛰어놀려면 그런 활동을 적절히 뒷받침하는 사회적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사회적인 안전장치나 제도적인 지지보다는 청년들의 마음가짐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해보려 한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청년과 비(非)청년을 구분하는 진짜 기준은 주민등록상 나이가 아닐지도 모른다.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 특유의 말갛고 싱그러운 태도다. 다시 말해서, 꿈을 꾸는 마음과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태도가 곧 청춘의 본질인 셈이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청년의 모습은 그렇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을 거라는 희망, 내가 꿈꾸는 세상이 언젠가는 도래할 거라는 확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 이런 것들이 진정한 청년의 조건 아닐까.
나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꿈을 꾸었으면 한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 꿈을 꾸었으면 한다. 혼자 꾸는 꿈은 몽상으로 끝날 때가 많지만 함께 꾸는 꿈은 사회를 움직이고 역사를 바꾸기 때문이다. 1963년 8월, 마틴 루서 킹 목사는 워싱턴 D.C.에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제게는 꿈이 있습니다).”이라는 연설을 했다. 인종 평등과 진정한 자유를 갈망했던 킹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공표함으로써 한 개인의 꿈으로 남고 말았을지도 모르는 염원을 모두의 비전으로 바꿔놓았다.
흥미롭게도, ‘자면서 꾸는 꿈’과 ‘미래의 순간들을 그리는 꿈’을 같은 단어로 표현하는 언어가 많다. 영어의 'dream', 프랑스어의 'rêve', 스페인어의 'sueño', 그리고 우리말의 '꿈'까지. 많은 언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혼자 꾸는 꿈이 현실 속에서 그려 나가는 이상에 반영되기 때문일 테다. 그래서 나는 청년들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홀로 상상하던 꿈을 현실로 끄집어내 다 함께 그리는 비전으로 확장해나갔으면 좋겠다.
사실 ‘함께’는 다소 번거로운 가치다. 무언가를 함께 하려면 꽤 공을 들여야 한다. 의견이 부딪히기도 하고 속도가 느려지기도 한다. ‘함께’라는 이름표가 붙으면, 혼자였다면 간단히 결정하고 말 일을 끝내는 데도 몇 배의 시간과 품이 든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많은 청년이 차라리 ‘혼자’를 택한다. 그러나 그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사단법인 ‘오늘은’이 공개한 <2024 청년세대 관계실조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호소한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덕에 어디서나,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정작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는 쉽지 않다. 연구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의 청년 중 4.6명은 ‘의미 있는 관계가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답변을 내놓은 응답자 중 약 절반이 단절된 삶을 회복하려면 ‘의미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내가 최근에 번역을 끝낸 <Wired to Connect(가제: 인간의 뇌는 관계를 원한다)>의 저자 에이미 뱅크스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한물간 촌스러운 이상쯤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저자는 사람 간의 경계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게 최근 학계의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함께 꿈을 꾸는 일은 어쩌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일인지도 모른다. ‘나’를 둘러싼 울타리를 걷어내고 서로 연대해 ‘우리’가 함께 꿈꾸는 비전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진짜 청년의 삶이다. 옆 사람에게 기꺼이 손 내밀고, 다른 사람이 내미는 손을 얼마든지 믿고 붙들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순간들이 모여 청년이 청년다워진다. 혼자 꾸던 꿈이 모여 불씨가 되고, 또다시 그 불씨가 모여 세상을 밝히는 횃불이 되는 그런 청년의 삶을 권하고 싶다.
* 글쓴이 - 김현정
읽고 쓰는 삶을 좋아하는 번역가입니다. 주로 경제경영 서적을 번역하고, 가끔 제 글도 씁니다. 취미는 책 사들이기입니다. 한강 작가가 어딘가에 적어둔 ‘읽은 책보다 읽을 책이 많은 책장’이라는 글귀를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도 책을 향한 저의 짝사랑을 불태우며 당당하게 책을 주문합니다. 이상은 높고 실천은 덜 하는 편이지만, 두루 책이라도 읽어두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 [청년담론]은 우리 사회 청년 문제에 관하여 많은 이들이 깊이 관심을 가지길 바라며 전하는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 <오늘은, 청년예술>에서는 청년 담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기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chek68520@gmail.com으로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